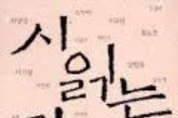
[한국현대시 詩 100선] 자화상 - 서정주
K-Classic News 원종섭 詩 칼럼니스트 | 자화상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틔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. - 서정주, 『시건설』 1939), 『화사집』 남만서고, 1941 '애비는 종이었다' 첫구절이 충격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천부의 시인 서정주가 스물세 살에 쓴 시입니다 국화옆에서, 귀촉도 , 동천, 푸르른 날 피와 본능과 운명을 격렬한 호흡으로 노래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